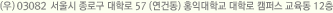Search
인기 키워드
전체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기자가 말하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
내가 이 공연이 더 궁금해질 때
박돈규 _ 조선일보 기자
.gif)
언젠가 꼭 말하고 싶었던 주제였다. 어느 시인은 '괴로운 길은 길다'고 노래했다. 나는 "좋은 보도자료는 짧다"고 우기고 싶다. 기자 생활 10년 중 공연 담당만 6년 하며 생긴 통박이다. 길거나 화려하거나 덩치(용량) 큰 보도자료는 십중팔구 '꽝'이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절대로 그런 보도자료는 쓰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면, 그렇게 길게 써봐야 다 읽지도 않는다.
공들여 쓴 보도자료에 대해 '꽝'이라니. 무례한 표현이라는 것은 나도 안다. 상사에게 여러 번 퇴짜 맞아 나름 통증과 눈물이 섞인 보도자료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 서로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프로 기자, 당신은 프로 홍보담당자다. 안면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만났으니 그 자체로 승부해야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숱한 보도자료를 보며 글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기자에게는 절대 다수의 보도자료가 '꽝'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공연면 20098년 11월 26일자](http://www.gokams.or.kr/DATA/PHOTO/01_06.gif) 공연도 그렇지 않은가. 관객 입장에서는 길고 재미없는 연극이 가장 고통스럽다. 한국의 소극장에서는 재미없다고 중간에 빠져나갈 수도 없으니 때론 지옥 체험과도 같다. 깊게 호기심을 건드리면서 짧은 보도자료라면 최상품이다. 기자는 당연히 더 캐묻고 싶어진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적힌 전화번호를 찾아 버튼을 누른다. 그 순간 당신이 이긴 것이다. 그렇다. 좋은 보도자료를 보면 당장 통화하고 싶어진다. 기자란 그렇게 단순한 인간이다.
공연도 그렇지 않은가. 관객 입장에서는 길고 재미없는 연극이 가장 고통스럽다. 한국의 소극장에서는 재미없다고 중간에 빠져나갈 수도 없으니 때론 지옥 체험과도 같다. 깊게 호기심을 건드리면서 짧은 보도자료라면 최상품이다. 기자는 당연히 더 캐묻고 싶어진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적힌 전화번호를 찾아 버튼을 누른다. 그 순간 당신이 이긴 것이다. 그렇다. 좋은 보도자료를 보면 당장 통화하고 싶어진다. 기자란 그렇게 단순한 인간이다.
그런데 기자도 '작두'를 탄다. 내가 몸담은 [조선일보]의 경우 공연면은 매주 목요일에 발행된다. 수요일에는 거의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머리 쥐어뜯으며 손가락으로 작두를 탄다. 그러나 바로 그 전 단계는 '캐스팅'이다. 그 주의 한정된 지면을 채울 '글감'을 가려 뽑는 것이다. 당신이 쓴 보도자료가 주인공 또는 조역, 단역으로라도 그 무대에 오르려면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재미, 감동, 광기, 서프라이즈, 트렌드…. 그 무엇이 됐건 말이다.
철저하게 '무엇'에 집중해야
얼마 전 한 공연 홍보 담당자가 내 앞에서 말했다. "홍보는 제 적성이 아닌 것 같아요. 목적을 가지고 사람(기자)을 만나야 하니까." 그렇다. 보도자료는 목적이 분명한 글이다. 그 목적이란, 쉽게 말해 기사일 것이다. 그런데 저 담당자의 말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전달하느냐(how)'를 걱정하고 있을 뿐 '무엇을 전달하느냐(what)'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보도자료는 철저하게 '무엇'(what)에 집중해야 하는 문서다(물론, 내용도 좋고 형식도 좋다면 뭘 더 바라겠냐마는). 내 경험으로는 '무엇'(what)이 별로라서 '어떻게'(how)를 걱정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건 사기 아닌가? 보도자료가 과대포장과 거품, 거짓말과 기만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을지언정 담당 기자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잃게 된다. 따라서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은 무엇(what)은 좋은데 어떻게(how)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으면 한다. 그러길 바란다. 보도자료에도 정답은 없지만 지금부터 밝히는 내용은 나를 비롯해 여러 기자들의 경험담이니 참고가 될 것이다.
공연 담당 기자는 하루에 보도자료를 약 100개 받는다. 나만 해도 담당 분야가 연극·뮤지컬·무용에다 문화체육관광부(산하 기관이 40여개)이니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 대부분은 이메일로 보도자료가 오고 10~20건은 신문사로 배달된다. 기자간담회에 나가 받는 자료도 있고, 약속을 잡고 취재원을 만나 자료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보도자료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차라리 내가 받고 싶은 보도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낫겠다.
내가 받고 싶은 보도자료
A4로 5장 이하다. 절대로 파워포인트로 작업하지 않는다. 평범한 문서형식에 첫 장은 공연 제목을 적고 제작(극단), 일정, 장소, 공연시간, 출연진, 입장권 가격, 작가, 연출, 출연진(배역까지), 스태프, 홍보 담당자, 연락처(유선+핸드폰까지), 웹하드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기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한다(이것부터 문제인 자료들이 의외로 많다).
두 번째 장에는 왜 지금 한국에서 이 공연을 하는지 적는다. (아무 이유 없이 공연되는 것 같은 작품들이 너무 많다.) 공연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감동적인 작품이 요즘 너무 없어서, 또는 요즘 공연계의 트렌드라서, 또는 어느 작가가 어느 연출가가 오랜만에 내는 신작이라서, 또는 개그콘서트가 울고 갈 코미디라서, 또는 어떤 사람의 데뷔작 또는 추모작이라서, 또는 썩어빠진 연극판을 깨는 실험이라서, 또는 문예진흥기금을 이미 받아 올해 안에 공연해야 하기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신문기자가 어떤 기사를 쓰려면 반드시 '왜'(why)가 필요하다.
세 번째 장에는 공연의 줄거리를 10~20문장 정도로 요약한다. 대부분 '철수는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로 끝을 맺는데 기승전결을 전부 다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단, 관객을 위해 가급적 어떤 장면부터는 감췄으면 한다면 그것을 명기한다(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줄거리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기자는 무능하거나 게으른 기자다. 파장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기자가 기대해도 좋을 공연의 주요 장면들, 볼거리, 특별한 소품이나 무대 디자인, 음향, 분장, 조명 등이 있다면 역시 기록해둔다(공연은 배우·작가·연출의 것만이 아니니까).
네 번째 장에는 보통 프로그램에 실리는 제작·연습 일지 등의 '말말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한 공연으로 뭉친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함께 어느 곳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어떤 인물 또는 감동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땀 흘렸는지 등을 알 수 있었으면 한다. 사진이 있다면 여기 붙이고 간단한 사진 설명으로 누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한다. 과거 히트한 공연이라면 그와 관련된 기록들, 수치들을 참고로 넣어줘도 좋다.
다섯 번째 장에는 '이 공연을 보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제목으로 자유로운 글 또는 낙서가 있었으면 좋겠다(아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서울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공연장과 엄청 더 많은 공연이 공급되는 곳이다. 기자 역시 공연을 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골라 본다. 때론 어떤 공연을 놓치고 후회한다. 다시 볼 기회는 영영 안 올 수도 있고, 그 낭패감은 평생 회복불능이다. 무명작가, 무명연출가가 무명배우들과 만든 작품일지라도 홍보 담당자가 '안 보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라고 자신한다면 그 어떤 기자가 무시할 수 있겠나. 물론, 가서 봤더니 '꽝'이라면 더 큰 것을 잃을 테지만.
좋은 자료에서 좋은 기사 나온다
단순하다. 좋은 인풋(input)이 있어야 좋은 아웃풋(output)을 기대할 수 있다. 재료가 신선하지 않은데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 수 있겠나? 물론 기자마다 취향과 관심사, 또는 재료를 취하는 패턴이 다를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공부 또는 눈치도 필요하다. 신문을 보며 '어떤 기자는 어떤 '캐스팅'으로 지면을 꾸미는구나'를 알아두면 스마트 폭탄처럼 공략(?)할 수 있다.
.gif) |
필자소개 |
 |
. |  |
덧글 8개
- 김의숙
- 2009-12-04 오전 11:39:03
- 여성문
- 2009-12-06 오전 12:09:48
- 김도희
- 2009-12-07 오전 12:05:46
- 송현지
- 2009-12-08 오후 3:09:52
- 변고은
- 2009-12-18 오후 7:28:03
- 신성훈
- 2010-02-14 오후 2:45:50
- 박으뜸
- 2013-05-30 오전 5:13:02
- 정준희
- 2013-11-27 오후 2:30:11



.gif)
.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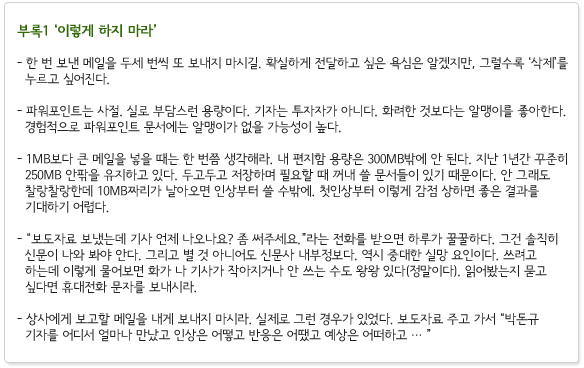
.gif)